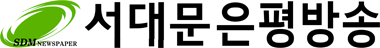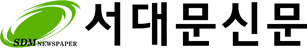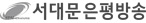나는 죽었노라 스물다섯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숨을 거두었노라
대한이 혼이 소리처 달리었노라
산과 골짜기 무덤과 가시 숲
원수를 밀어가며 싸웠노라
나는 더 가고 싶었노라 원수의 하늘까지
나는 새 나라의 새들과 함께 자라고 노래하고 싶었노라
그래서 용감히 싸웠노라 그러다가 죽었노라
이 글은 모윤숙(毛允淑 1910-1990) 선생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라는 시의 중간 중간 몇 줄을 따낸 대목이다. 오늘날 6.25를 체험한 세대들은 이 시를 학교에서 배우거나 방송에서 듣거나, 책에서 보거나 하여 익히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것은 이 시처럼 한 병사의 주검을 통해서 조국수호의 뜨거운 피가 용소숨치게 하는 애국심, 꽃잎처럼 사라져간 한 젊은 생명의 애절함 속에서 눈물을 참을 수없게 하는 말 또는 노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는 6.25 민족 상잔의 비극을 언제나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올해로 6.25전쟁 66주년이 됐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과 UN군 장병 여러분의 명복을 머리 숙여 빈다. 그때의 상혼으로 아직까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과 전몰장병 유가족 여러분께는 위로와, 참전용사 여러분의 공헌에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6.25전쟁은 우리 민족 최대의 재앙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4시 공산국가인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북한 김일성 집단이 38선을 넘어 한국을 침략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지기까지 3년 1개월동안 남북간에 벌어진 군사적 싸움이다.
공산권에서는 북한, 소련, 중공, 자유진영에서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UN 16개국이 참전한 전쟁이다. 이 전쟁으로 전국토는 폐허가 되었으며 한국군 14만 7천명을 포함하여 UN군이 18만명 이상 전사했고, 북한군 52만명, 중공군 90만명이 전사했다.
북한은 8만 5천명에 달하는 남한의 인사들을 납치해 갔고, 또한 북한으로부터는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백만명의 민간인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 왔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모든 참전국들의 희생자를 전부 합치면 2백만명이 넘는다.
우리들에게 6.25 북한의 남침은 결코 잊혀진 전쟁이 아니다. 아직도 남북이 총뿌리를 맞댄 휴전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핵무기 운운하며 엄포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평화는 그것을 지킬 힘이 있을 때만 지켜질 수 있다.
확고한 안보태세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미 동맹도 더욱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 미국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지구 반대편의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찾게 만든 힘은 무엇이었을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불굴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 했다고 생각한다. 참전 용사 여러분의 결단이 자유민주주이가 승리한 역사로 자리매김했다. 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국가 유공자들의 공훈(功勳)을 진심으로 보답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겠다.
강 원 호 본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