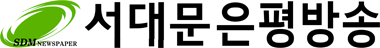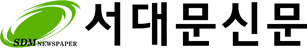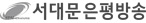옛날 춘추전국시대에 아름다운 바닷새 한마리가 노(魯)나라 교외에 날아와 앉았다. 새를 사랑한 노나라 임금은 이 새를 친히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와서 술을 권하고, 아름다운 궁궐의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하였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하기만 할뿐, 고기한 점 먹지 않고 술도 한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다. 장자는 그것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장자』외편 지락(至樂)중).’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수많은 만남을 경험한다. 고대에는 개인 한 생애의 만남이 150여명이었다면 중세에는 1500여명, 현대에는 SNS의 발달로 7만여명~15만여명에 가깝다고 한다. 풍성한 만남만큼 참다운 만남의 숫자가 비례한다면 인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달을 왕복할 수 있지만 우리 이웃에 한 걸음 내딛고 친해지기는 어려워졌다’라는 팡짜오후이의 글처럼 진정한 만남은 오히려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부부, 친구, 이웃...그 누구도 내 사랑의 대상은 타자(他者)다. 타자는 나와는 다른 삶의 규칙과 가치를 따르는 존재다. 그러므로 타자가 원하는 것을 읽어내어 그에 알맞은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방식대로 간섭하고 구속하고, 집착하려 들면 안 된다.
그래서 장자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을 타자에게도 똑 같이 해 주어라" 라고 했으며, 묵자는 ‘나’만 원하는 구별된 사랑인 별애(別愛)가 아닌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공생’적 겸애(兼愛)를 강조했던 것이다.
퇴근길 라디오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뮤직스토리가 아름답고 훈훈하다. “2011년 브라질 해변에 펭귄 한마리가 기름을 둘러쓴 채 떠내려 왔다. 펭귄을 발견한 할아버지는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일주일동안 깨끗이 씻기고 먹이를 주며 보살폈다.
그 후 회복된 펭귄은 바닷가로 돌려보냈는데 다시 되돌아와 11개월을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 후부터 펭귄은 4년째 자신의 서식지인 칠레의 카타고니아 에서 해마다 6월경이면 8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브라질까지 헤엄쳐서 할아버지를 만나러 온다”.
만남... 펭귄이 그 먼 거리를 목숨 걸고 헤엄쳐 할아버지를 만나러 온다는 것, 그 만남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인간과 입장을 바꾸어본다면 도저히 마음만으로는 불가능한 영혼의 교감이고, 소통이고, 절대적 필요한 움직임이다.
그러니 행위가 따르지 않는 ‘마음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영혼없는 가짜 만남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투자의 귀재 워런버핏은 ‘성공은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다’라고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가기 좋은 봄날이다. 진정한 만남의 감동이 꽃처럼 피어나는 4월의 성공을 기대해본다.